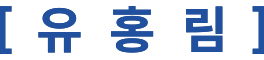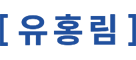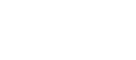인터뷰 링크: 한국일보

한국일보
서울대가 국립대 옷을 벗고 ‘국립대학법인’으로 탈바꿈한 지 10년이 지났다. 법률상 의무와 권리를 갖는 주체로서 서울대가 얻고자 한 것은 재정과 자율성이었다. 일각에선 법인화로 인한 서울대의 상업화를 우려했지만,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국제 인프라에 투자하며 불식시켰다.
그렇다면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의 자율성은 과연 생겼을까. 국고출연금을 매개로 한 국회와 교육부의 간섭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010년 서울대 발전실행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인화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던 유홍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학장은 “자율성 정도를 가늠하려면 외부 제재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따지기보다는 자기 혁신이 가능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플랫폼을 캠퍼스 밖으로 더 확장하고, 조직을 쇄신해 서울대 스스로 자율성을 찾는 게 법인화 10년 이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학문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움직여야
서울대 법인화 논의는 1980년대부터 나왔다. 국내 최고 대학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서울대의 존재 이유를 찾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아탑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직성은 법인화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 학장은 “사회에 교육·연구 활력을 일으키는 게 대학의 책무”라며 “학문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오는 대학을 넘어, 학문이 필요하지만 닿지 못하는 곳까지 직접 움직이는 ‘아웃리치(Outreach)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성하는 데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웃리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이 정착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 유 학장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는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대학’을 구축했고, 미네르바 스쿨 등에선 캠퍼스를 지역 사회와 연결해 평생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서울대도 이 같은 플랫폼 혁신 모델로 참고 중”이라고 전했다.
전통적 학제 구분 벗어나야
플랫폼뿐 아니라 조직을 혁신하는 것도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장기 과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조직을 전통적인 학제를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스피치·광고·저널리즘 학문이 모여 ‘언론정보학 전공’이 되는 식이다. 최근 발간된 ‘서울대 법인화 10주년 백서’에서도 고정된 교육 조직을 아쉽게 평가했다.
유 학장은 성격이 다른 학문들을 전공으로 묶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학문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학문 융합을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러시아역사학과 철학이 각각 운영되면서도 둘을 융합하면 ‘러시아 혁명 전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처럼 연구 대상이 많다면, 경제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분야별로 학문이 발전하면 서울대가 전국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수월해진다는 게 유 학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전국구 교수들이 학문 분야별로 모이면 팀 티칭과 교수 토론과 같은 다양한 수업이 실현된다”며 “학부생은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문 융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획일적 평가 벗어나 지속가능한 목표 필요
그럼에도 국내에선 당장의 생존을 위해 혁신의 방향성을 획일적 평가 지표에 맞추는 대학이 적지 않다. 유 학장은 이에 대해 “아무리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고 해도, 대학 스스로 설득력 있는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돈과 권력의 영향을 받기 쉽다”며 “자율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생존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서울대의 법인화 취지를 살리려면 목표가 무엇이든 교수·학자·학생 모두가 변화를 위한 비판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학장은 “어렵게 쌓아온 서울대의 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서울대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